그런 김 대표의 대표 상품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고비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통과시킨 공천 혁신안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배제함에 따라 양당 합의에 따른 전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야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단독 시행을 추진해야하는데, 그 경우 비용 문제와 역선택 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립이라고 여겨왔던 원유철 원내대표마저 "국민공천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빨리 모색해 내놔야 내년 총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했지만 여당 투톱 사이 이견이 처음 표출됐다. 김 대표를 중심으로 측근인 김학용, 김성태, 강석호 의원 등이 오픈프라이머리 관철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을 설득하기도 전에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김 대표 측은 친박의 공세 목표가 공천 지분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략공천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당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흔들고 있다는 게 김 대표측 해석이다. 대표적인 게 대구다. 9월7일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 때 현역 의원들 전원이 초대받지 못했다. 대신 안종범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 측근들을 대동하면서 대구 물갈이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지 분위기는 매우 힘든 것으로 듣고 있다"며 대구 현역 의원들을 겨냥했다. 그리고 22일 전광삼 청와대 춘추관장이 사임했다. 대구 북구갑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 물갈이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대구 차출설도 심심찮게 나돈다.
이런 상황 속에 김 대표의 발언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보인다. 18일 성균관 추기석전 후 기자들을 만난 김 대표는 플랜 B 요구 목소리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는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론으로 관철시키는 게 안된다고 확정될 때는 그 때 가서 또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정해진 만큼 방향을 트는 것도 당론을 통해서 가야한다는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는 2차례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위기를 넘겨왔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악재와 주변의 우려를 선거 승리로 불식시켰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의 성패는 기존의 위기와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 내년 공천의 주도권은 곧 의원 개개인, 계파의 생사 여탈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표 취임 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김무성 대표의 선택에 여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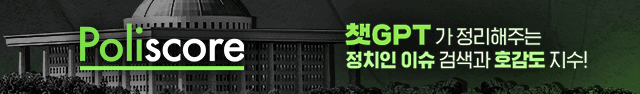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