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번째를 맞는 제헌절을 맞아 국회는 며칠 전부터 단장을 시작했습니다. 본관 건물 앞에는 제헌절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음악회를 위한 무대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음악회는 세월호 참사 분위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축제준비가 한창인 국회 본관 현관 앞에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현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단식 농성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매일 이곳을 찾는 가족들입니다. 반별로 각기 다른 티셔츠를 맞춰 입고, 반별로 식사를 함께 하고, 반별로 같이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연중행사 중 하나인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귀빈 500여 명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피켓을 들고 줄지어 섰습니다. 현관 앞에 줄줄이 도착하는 검정색 고급 승용차에서 귀빈들이 내립니다. 가슴마다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대답 좀 하고 가십시오! 우리 아이들 좀 봐 주십시오!” 누구도 가족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선거 때는 한 표 찍어달라고 일부러 찾아서 악수하고 읍소하고 큰절까지 하는 후보들도 많은데, 지금은 다들 우리 마주칠까봐 피해 다녀요. 국회는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 종이배를 접는 이유

“우리 아이들 배 타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배를 접는 거에요. 그리고 하늘로 편히 가라고 비행기 접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종이 접는 거에요.”
비가 온다는 예보와 다르게, 날이 맑습니다. 2학년 8반 가족들이 국회 앞마당 잔디로 갑니다. 종이배로 “2-8 사랑해”라는 글을 잔디에 수놓습니다. 이어 품에 안고 온 종이비행기를 하나씩 날려 보냅니다.
“2학년 8반 아들들, 너무 사랑해. 우리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 저 OO 엄마에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잘 계신거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제 목소리 듣고 계신거죠?”
아빠 없이 자랐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컸던 아들. 때론 친구 같고 연인 같았던 외아들이 오늘따라 더 그리운 엄마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커져가는 그리움만큼 국회 앞마당엔 노란색 종이배들이 늘어갑니다.
● 큰 기대 안했지만, 작은 희망마저 무너져
국회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간 지 엿새, 유가족 20여 명은 나흘째 소금과 물, 효소만 먹으며 단식 농성 중입니다.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 졌고, 그늘 한 점 없는 국회 현관 아래서 얼굴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견디기 힘든 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국회 상황입니다.
오후 5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렬됐다는 통보가 전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16일, 그리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족들은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결과를 봐서는 결렬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의 희망이었다고 하면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특단의 결단을 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근데 그 희망도 이제 없어진 거죠.”
●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엄마는 밤새 모기가 뜯고 간 팔 다리를 내밀어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 새끼가 죽었는데,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특례입학이 중요합니까? 우린 그걸 원한 게 아닙니다.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나중에 내가 죽어 하늘에서 내 새끼를 만났을 때, 떳떳하고 싶은 겁니다.”
가족들은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정치권이 정작 진상규명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 낼 수 있느냐가 아닌 보상이나 특혜를 대단한 성과물처럼 꺼내 든다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우리만을 위한 거면, 여기 안 옵니다. 그냥 이 나라 다 잊고 이민가면 끝나는 거에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전까지는. 뭐가 잘못 된지도 몰랐어요. 내가 당하고 보니까, 내 자식을 보내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됐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 자식 죽었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내 새끼 아니어도 좋다. 한명만, 제발 한명만이라도 살려 달라. 다시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으로 여기 온 겁니다.”
세월호 국회로 시작한 6월 국회가 끝났고, 오늘 다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가 이번에는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제헌절 국회에서의 짧은 소회를 ‘헌법 제1조’와 세월호 가족의 외침으로 갈음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축하하게 생겼습니까? 헌법이 죽었는데...”
![[취재파일] 제헌절, 축하하게 생겼습니까? 헌법이 죽었는데…](http://img.sbs.co.kr/newimg/news/20140721/200765775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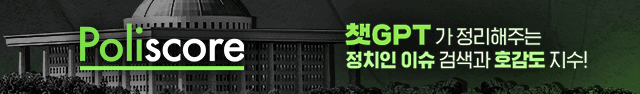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