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의 폭격 경고와 뒤이은 유조선 장악 선언, 이를 뒤집은 유조선의 리비아 영해 탈출과 리비아 의회의 자이단 총리 해임까지 엎치락 뒤치락하며 첩보영화를 보는 듯 반전이 거듭됐습니다. 결국 미국이 네이비 씰 특전단을 투입해 유조선을 나포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북한 국적의 유조선이 관련됐는 지 여부는 물론 리비아의 향후 정세, 그리고 ‘피봇 투 아시아’를 선언하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역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격적인 무력 개입 등 많은 얘기거리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건 리비아 반군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여 실은 모닝 글로리호에 인공기가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일부 방송과 언론들이 마치 현장 사진인 것 처럼 인공기가 걸린 뱃머리를 화면에 올렸지만 실제로 모닝글로리호에 걸린 인공기 모습이 정확히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태 파문이 확산되면서 북한 스스로가 이번 석유 거래와 무관함을 밝히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북한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골든 이스트 로지스틱스라는 물류회사와 계약을 맺고 모닝 글로리호에 6개월간 선적(船籍)을 북한으로 하기로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유조선이 리비아 정부의 승인없이 반군으로부터 원유를 선적한 불법 거래에 연루되자 북한은 계약 조건 위반이라며 이집트 물류회사와의 계약 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네이비 씰 요원들을 투입해 지중해 공해상에서 모닝 글로리호를 나포한 미국도 이 배가 ‘a stateless vessel’, 즉 ‘무국적선’이라고 확인해 단순히 계약에 의해 선적만 빌려줬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의문은 이 유조선에 실린 원유의 행선지가 북한이 아니라면 어디냐는 점입니다.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도 반군과의 불법 석유거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누가 과연 반군의 돈줄이 될 석유거래에 나섰는 지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계약을 맺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물류회사 골든이스트 로지스틱스 측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그들은 북한과의 선적 임차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화주(貨主)가 누구인지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모닝 글로리호의 행선지가 북한이 아니라 유럽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2> 석유 거래에 나선 리비아 반군의 의도는(?)
비록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리비아 정부를 무시하고 석유 거래를 강행한 리비아 반군은 리비아 중앙 정부는 물론 미국 등 서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이번 석유 거래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리비아 석유 수출항 중 한 곳인 브레가 출신으로 카다피 축출을 목표로 한 2011년 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33살의 이브라힘 자트란이라는 군벌입니다.
2011년 내전 이후 좀처럼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리비아에서는 여러 군벌과 무장세력이 난립하고 있는 데, 이 가운데 자트란은 브레가는 물론이고 반 카다피 시민혁명이 시작된 벵가지 등 리비아 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무장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트란은 군벌과 무장세력, 지역 부족들을 중심으로 찢긴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리비아를 아예 1951년 독립 이전처럼 3개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리비아는 과거 동부의 사이레나이카, 서부의 트리폴리, 남부의 파잔 등 3개로 나뉘었다가 왕정을 거쳐 카다피 체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
자트란이 리비아의 분리 자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자원 수출을 통한 이익의 불균형한 배분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유 60% 이상이 매장된 동부지역이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이익 독점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아 낙후됐다며 자치와 석유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의 핵심 석유 수출항이 자트란을 지지하는 반군의 수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인공기 유조선 사건으로 불거진 반군의 독자적 석유 거래 시도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3> 리비아 정부는 뭐했나(?)
이처럼 반군이 항구를 장악하고 국가 핵심 자원인 석유 수출을 강행하려 시도하는 동안 리비아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폭격을 불사하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군은 총리의 명령을 거부했고, 유조선 출항을 막기 위해 해군 함정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뒤로 들리는 얘기는 해군이 명령을 거부해 자이단 총리가 트리폴리 동부 미스라타 지역의 민병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해 무장병력 몇몇이 민간 배에 무기를 싣고 출항저지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유조선이 리비아 영해를 빠져나가 공해 상으로 진입하는 걸 막지 못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도대체 리비아 정부가 어떤 상황이길래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리비아 임시 정부는 카다피 시절 1인자에 의한 권력 독점의 폐해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과 주변세력들은 자이단 총리와 대립하며 몇 달전엔 자이단 총리를 납치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리비아 의회의 핵심 인사들은 자이단 총리의 폭격 명령을 군이 거부하도록 배후에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물론 해양 오염 우려와 민간 피해 가능성 때문에 애초부터 유조선에 대한 공중폭격이 불가능했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
그런데 정작 총리의 손발을 묶었놨던 의회는 반군의 불법 석유 거래 시도와 유조선 도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자이단 총리에게 덮어 씌워 그를 해임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수렁에 빠진 리비아 정치권의 혼란은 치안과 행정 공백을 장기화하고 군벌과 무장세력이 정부의 빈자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손뗀다던 미국, 갑자기 왜 나섰나(?)
문제의 유조선이 리비아를 벗어난 이후 행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던 지난 월요일,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모닝글로리호에 대한 나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 인근 공해상에서 미군 특전단 네이비씰 요원들이 배에 올랐고, 별다른 저항없이 유조선을 장악합니다. 당시 유조선엔 반군으로 추청되는 무장 리비아인 3명이 타고 있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자국의 이해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리비아 반군의 석유 거래에 미국이 갑자기 왜 나선 것일까요? 그것도 네이비씰 요원들을 투입한 군사작전까지 벌인 것은 리비아 내전은 물론이고 시리아 내전과 아랍 시민혁명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직접 개입을 자제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중동 전략과는 극히 어울리지 않는 대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가 새로운 반미 이슬람 전선의 해방구가 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난 2011년 카다피 축출 이후 벵가지를 포함한 리비아 동부와 남부 사막지역에서는 카다피 치하에서 억눌렸던 이슬람 과격파들이 발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리비아 동부는 이슬람 원리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수피즘’이라 불리는 신비주의적 이슬람 교파가 상당한 세를 얻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카다피 시절 교파를 막론한 이슬람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정에서 이슬람 과격파들이 지하화해 기존의 수피즘 신봉자들과 결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카다피 축출 과정에서 이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지난 2012년 9월 11일 벵가지 미국 영사관 습격사건으로 스티븐스 미국 대사 등 외교관 4명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리비아 동부의 혼란이 단순히 리비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리비아 동부는 이집트 서부 사막지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광활한 국경선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 카다피 축출 내전 때 서방이 지원했던 엄청난 양의 무기가 밀거래를 통해 이집트 내 이슬람 과격파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넘어 온 무기들은 지난 해 군부 쿠데타 이후 수백명의 군인을 살상한 이집트 내이슬람 무장세력에게 공급되고, 다시 이스라엘과 맞닿은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 등 또다른 이슬람 무장세력에게 넘어가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랍의 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과격파들이 활개치고 있는 리비아 동부에서 반군이 석유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하는 건 미국에겐 재앙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비아의 분열과 혼란을 넘어 안 그래도 아랍의 봄 이후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 과격파들의 세가 들불처럼 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중동지역에서의 급속한 영향력 쇠퇴로 고민이 깊은 오바마 정부는 이번 사태로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한 세기 전 제국주의 시절부터 서방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무시한 채 이어져 온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 만들어 낸 덫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덫에서 벗어나려 중동 문제에 대한 거리두기와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한 ‘피봇 투 아시아’를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천명했지만, 몸부림치면 더 발목을 죄는 덫처럼 오히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미국이 도저히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 인공기 유조선 사건의 전말…美 왜 네이비 씰을 투입했나?](http://img.sbs.co.kr/newimg/news/20140312/200735749_12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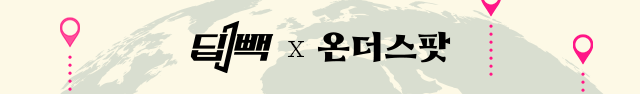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