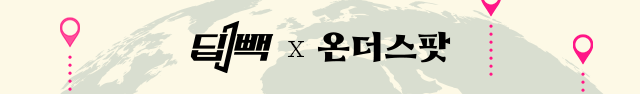미국 로또복권인 파워볼의 당첨자는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44살 이민자였습니다. '페드로 퀘사다'라는 이 남성은 뉴욕에서 가까운 뉴저지주 페시악이란 곳에서 7년 전부터 식품 잡화점을 운영해왔습니다. 다섯 자녀를 둔 그는 많은 미국 이민자들이 그렇듯 밤낮없이 일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왔는데 거의 하루도 빼지않고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돈을 다 받게되는 것일까? 미국 복권 시스템의 구조상 실제로 받는 당첨금은 발표액보다는 크게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비노동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고, 이것 저것 내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언론들은 이번 1등 당첨금이 일시불 방식으로 지급되면 총액은 2억2천100만 달러, 세금을 떼면 약 1억 5천200만 달러, 1천68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절반보다 더 많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당첨자 가운데 이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는 듯 합니다. 선택 옵션 중 하나인 29년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면 총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2천4백억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당첨자들은 일시불을 택하는데 그 이유는 목돈이 생기면 그돈으로 다시 큰 부를 창출하기 쉬운 미국의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또 당장 돈을 챙겨 어디론가 공간을 옮겨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욕망이 그만큼 크지 않을까요? 로또복권처럼 파워볼은 흰색 공 59개 가운데 5개 숫자, 또 붉은색 공 35개 가운데 1개 숫자를 추가로 맞추면 1등이 되는데 그 확률은 약 1억 7천500만 분의 1, 자극적인 표현을 잘 쓰는 뉴욕언론들은 "한 해 동안 벼락에 한 번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거액 복권당첨자의 사연이 언론에서 소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호황을 누리는 복권산업의 이면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갈수록 벌어지는 미국의 소득격차가 이런 복권 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황일 수록 복권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만해도 미국인들이 복권을 사는데 쓴 돈이 무려 71조원에 달하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분상승이 요원해지고 자본을 가진 사람이 다시 부를 창출하는 구조가 공고화되면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실제로 실업율이 높으면 복권판매가 증가한다는 통계도 확인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불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는 줄이는 대신 소규모 배당이 걸린 도박에는 계속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둬쳐졌다고 느낄 때 이를 만회하려는 심리가 복권값의 리스크를 감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권 값은 도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기적인 복권구입은 주기적인 카지노 출입에 육박하는 지출을 동반한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당첨금이 쌓일 때마다 무슨 경제지표처럼 크게 보도합니다. 모바일에서 보는 뉴스 속보에도 이 액수와 함께 당첨번호가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이니 얼마나 수요가 큰 소식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복권으로 나오는 판매대금의 60%는 당첨금으로 지급돼지만 25%가 각 주정부의 수입이 되면서, 이 돈이 교육, 인프라 건설 등에 쓰이는데, 부유층 소득세 등 정상적 세수가 아닌 서민들이 추가세금을 내는 격이라는 비판이 진보적 언론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거액 복권당첨 소식이 미국사회 주류계급이 저소득층의 불만을 잠재우는 이벤트로 이용된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녀들의 엄청난 교육비에 끝없는 무력감을 느낄 때, 미국의 가장들은 복권을 사며 희망을 느끼는 듯 합니다.
'인생역전'은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통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 말이죠.
![[월드리포트] 美 복권 열풍의 '어두운 그림자'](http://img.sbs.co.kr/newimg/news/20130410/200656320_1280.jpg)